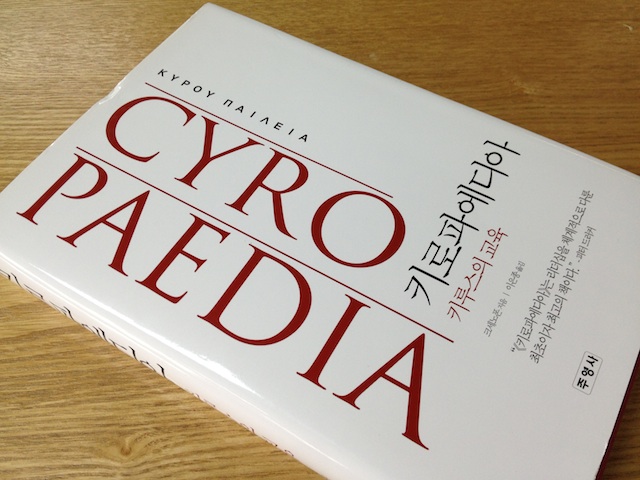특별한 기회가 주어져 이틀 연속으로 각각 다른 우리말 설교를 영어로 동시통역을 맡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짧게는 25분, 길게는 60분에 가까운 설교 시간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위해 불충분한 통역이라 할지라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에서의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객이 소수이므로 방송실에서 동시통역을 하면 무선수신기를 통해 이어폰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교를 영어로 옮길 경우 특히나 난감하게 느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신학용어: 해당되는 영어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 예컨대 ‘설교학’을 영어로 ‘homiletics’라고 한다는 걸 겨우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약학’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물: 영어식 발음을 모르는 경우. 예컨데 다리오(Darius)왕의 영어식 발음은 ‘드라이어스’고 아이(Ai)성은 ‘에이아이’다. 후자의 경우 영어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아하수에로’왕이나 ‘아닥사스다’왕은 영어로 과연 어떻게 발음할까? 이런 단어들은 준비없이 맞닥뜨리게 되면 아주 곤란하다. 이런 특별한 단어의 영어 발음을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의 성경 앱에서 영어 본문을 찾은 뒤 읽어주기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 한국 특유의 문화나 시사적인 내용이 소재로 등장할 때: 직역하면 의미전달이 안 되므로 별도의 해설을 곁들여야 하는 경우. 예컨대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예화로 언급될 경우 최근 영문 번역판이 ‘Please Look After Mom‘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음을 모르면 난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는 어설프게 통역하려다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번 경우에는 급하게 섭외가 되어 거의 설교 시작 직전에 원고를 건네 받은 관계로 사전 번역을 해놓을 여유조차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과연 통역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로 노심초사했을 텐데 최근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없이 했다. 통역에 참여함을 통해 설교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손님을 대접할 때 음료나 간식거리를 내놓을 경우 서빙하는 사람이 음료나 간식거리를 미리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하는 바인데, 그 이유는 손님에게 무얼 내놓는지 알고 대접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예방하고 또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역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그 품질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성격을 가진 통역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다:
- 서비스 제공자(통역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외국인 손님) 사이에서 통역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후 서비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외국인들에게 설교 통역이 어땠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솔직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교회 측에서 통역자에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을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껄끄럽다
- 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체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가 없다.
- 자신의 오타를 발견해내기 어렵듯이 통역자 본인이 자신의 통역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맥락에서는 어떤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지, 성공적인 사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안 등을 교회 측에서 문서형태로 준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다면 자발적 서비스라는 특징에 어울리는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서비스 모니터링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를 함께 임명해서–서로 누군지 모르게–지속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회에서의 통역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 설교 내용을 미리 번역하여 문서 형태로 제공해서 각자 읽게 하거나 화면에 자막으로 제공한다
- 번역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설교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읽을 수 있게 한다
-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집회 중간에 모시고 나와서 남은 시간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나눔 중심의 영어 모임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