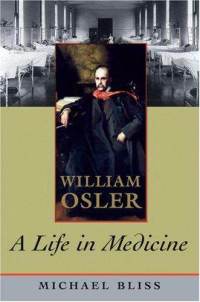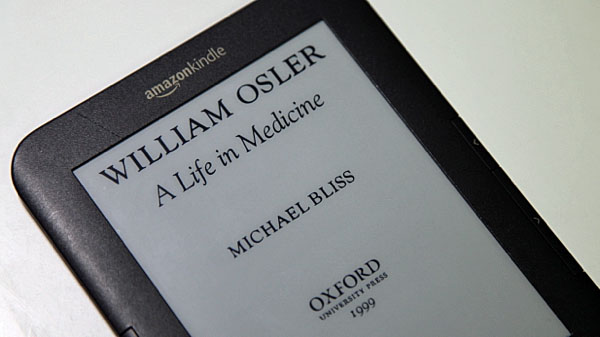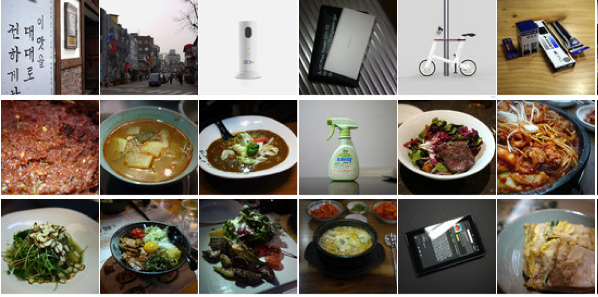영어로 쓰인 책도 읽고 영어책 번역도 하고 아주 가끔 통역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라이브로 만나는 영어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까페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음료 주문하는 것 조차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영어를 책으로 읽을 때와는 달리 실제 상황에서의 영어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1) 주변 소음, (2) 말하는 이의 액센트(억양), 그리고 문화적 문맥(context).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소음. 나는 청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예민해서 작은 소음까지 신경을 써서 그런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서양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 자기 소개하고 지나가는 잡담 잠깐 나누고 또 다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하는 파티를 즐기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이 안 된다. 적응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일대일로 대화하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쿵쾅거리는 배경음악 소리까지 겹치면 나는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 고개를 끄떡거리는 어색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때론 상대방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 무안함에 자연스레 그런 회합을 피하게 된다.
다음은 액센트. 책을 읽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이건데 실생활에서는 해석해야 하는 정보의 층(layer)이 억양의 형태로 추가된다. 미국도 땅이 넓은지라 지역에 따른 지방 억양이 있는데 빨리 말하면 소음없이 일대일로 이야기해도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로 무안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그래요? 아 그렇군요” 라고 일반적인 답변으로 넘어가곤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좌절스럽다. 또한 이민자들이 많아서 출신 국가에 따른 억양차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문맥. 이것은 상대방의 문화가 가지는 무언의 규칙을 이방인인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다. 예컨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의례히 먹고 가는지 아니면 가져갈 것인지 묻는 패턴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으로 “Here or to go?”라고 묻는 말에 적당히 응수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기대조차 못한 사람은 난감하기 일수다. 더 나아가 정부 관료나 기업체 임원들이 모이는 세련된 사교 모임에서는 더더욱 이 사람들의 일반적 응대 패턴이나 그 당시의 화제 거리에 대한 예비 지식 없이는 제대로된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뉴스 헤드라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는 정도의 정성은 필수다.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전에 상대방의 출신 지역 야구팀 또는 미식축구팀의 최근 경기 결과를 찾아보고 만날 때 한마디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Context를 알면 text를 완벽하게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텍스트를 정확하게 알아도 컨텍스트를 모르면 상대의 의사를 해석하기 어렵다. 문맥이 없는 대화는 깊이가 없다. 이를테면 I a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a pen. 수준의 대화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정세, 시사 뉴스, 스포츠, 정치, 연예 등 일반적인 화제거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나로서는 처음보는 사람과 할 이야기가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도 장단을 맞춰주지 못해 미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출장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지 자기 아내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라고 말해줬다. 나름대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공통의 소재가 될만한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매너있는 센스를 발휘해 준 셈인데 지난 10년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을 포함해서 그 유명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은 나로서는 적당한 응수를 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난점 모두 시간을 두고 상대의 문화에 젖어드는 기회를 가지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문맥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다른 이들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뿌와쨔쨔의 영어 이야기”라는 사이트(강력 추천)에서는 서양 문화의 문맥과 함께 영어를 설명해 줘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 국제 매너 참고서를 공부하는 것도 의외로 유용하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도 실생활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