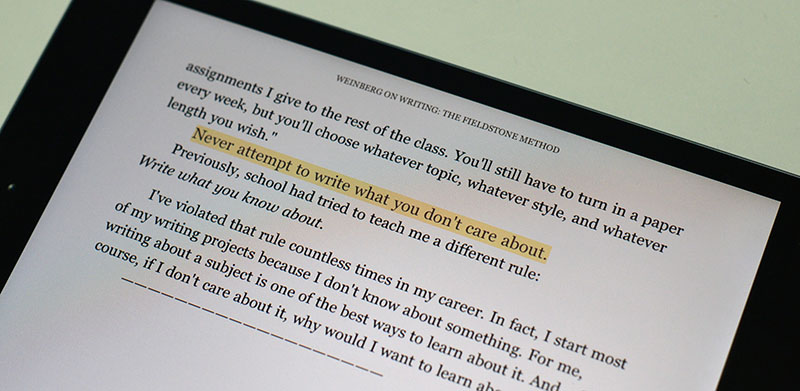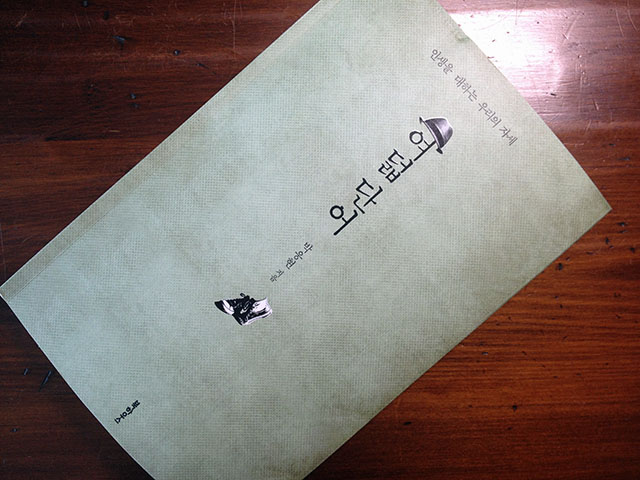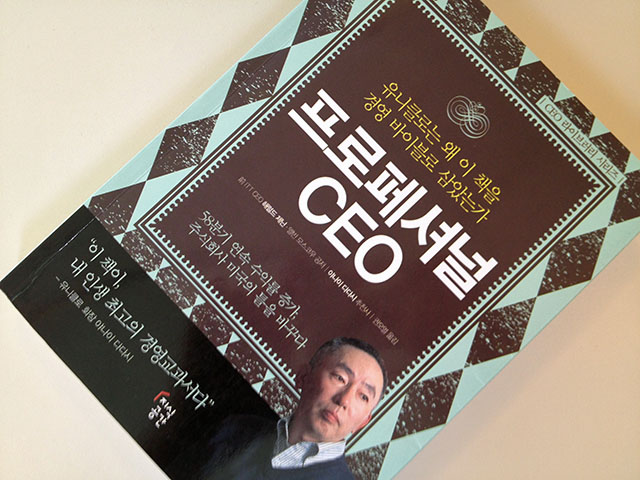요즘 읽고 있는 책: 아라후네 요시타카 외 8명 공저, 김나나 주미경 이여주 옮김, 맛있는 요리에는 과학이 있다, 홍익출판사. 이 책은 일본 宝島社사에서 펴낸 別冊宝島620 なるほどなっとく! おいしい料理には科学がある大事典을 옮긴 것이다. 각종 음식의 조리법과 연관된 과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인데 딱 내 관심사에 해당한다. 책을 읽기 전에 저자들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아라후네 요시타카(荒船 良孝) 1973년 사이타마현에서 출생하였고 대학 재학 중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주개발에서 곤충까지 폭넓은 분야를 커버한다. 특히 최첨단을 달리는 어려운 화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카와이 사치코(河合 佐知子) 1962년 시즈오카현에서 출생하여 토쿄농공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편집자 겸 작가이다. 《일본 동물 대백과》, 《식용어패(魚貝) 대백과》, 《일본의 들새 590》 등의 도감을 시작으로 단행본과 사진집의 편집을 하고 있다.
코야마 켄지(小山 健治) 1961년 토쿠시마현에서 출생하여 아이치공업대학 경영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생명, 르망레이스에 흥미를 가진 저널리스트이자 카피라이터. 저서로 《CALS를 알 수 있는 책》 등이 있다.
타카하시 시게유키(高橋 繁行) 1954년 교토에서 출생. 오사카시 주재의 르포라이터로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안 읽고 죽을 수 있겠냐! 장례식의 연구》 등이 있다.
타나카 시마코(田中 志磨子) 1977년 도쿄에서 출생. 작가이자 편집자이며, 오시에(일본 장식물의 한 종류)도 그린다. 일본의 예술과 교육, 특히 인지학의 길에 대해 모색 중이다.
나카가와 유키코(中川 悠紀子) 1967년 사가현에서 출생하여 교토부립대학을 졸업하였다. 진화론이나 동물생태학에서 민속학이나 심리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은 과학 전문 작가이다.
하기야 미야코(萩谷 美也子) 1961년 이바라키현에서 출생하여 조치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첨단기술의 연구 현황에서 소소한 일상까지 폭넓게 취재한다. 취미는 아라비안 댄스로 ‘춤추는 프리 라이터’로서 신체와 표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에도 점점 흥미가 생기고 있다.
야츠시로 타케루(八城 丈) 1965년 가나가와현에서 출생하여 도카이대학을 졸업하였다. 의학 전문 출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의료 저널리스트. 건강 잡지를 중심으로 활약 중이다.
야마자키 토모요시(山崎 智嘉) 과학 저널리스트이다. 환경, 음식, 의료, 정치 등의 사회 문제에서 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한다. 자연과 인간,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테마로 미래사회와의 접점을 모색 중이다.
— 아라후네 요시타카 외 8명 공저, 김나나 주미경 이여주 옮김, 맛있는 요리에는 과학이 있다, 홍익출판사 펴냄. 저자 소개 중에서
공저자의 짧은 프로필에 나타난 내용 만으로는 요리나 과학과는 별 관련이 없어보이는 인물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깊은 관심사와 재능은 짧은 프로필에 다 나타내기 어려운 법.
공저자 명단에 각자 태어난 해와 출생지역을 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미국책에서는 저자 소개를 할 때 가족 상황에 대한 소개, 즉 “Married, with two children” 식으로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적어놓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She lives in San Rafael, California, with her son, Sam.”
— Anne Lamott, Bird by Bird: Some Instructions on Writing and Life, Anchor Books의 저자 소개 중에서
저자의 프로필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지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