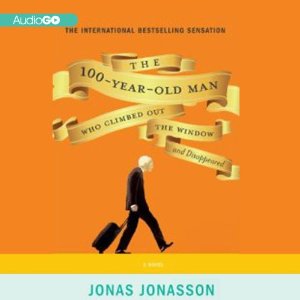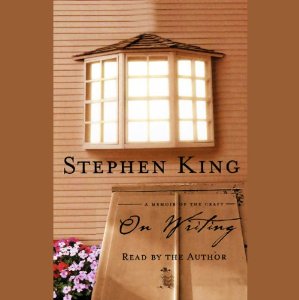위의 사진은 지하철 승강장 방독면 보관함에 부착된 사용 안내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이 제품의 명칭은 “화재용 방독면”이다 – 왠지 “화재용(用)”이란 표현은 어색하다. “비상용 방독면”, “일회용 방독면”, 혹은 그냥 “방독면”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다음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화재용”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썼는지도.
- 전쟁가스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 우선 왜 전쟁가스시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영어로 “Do not use in CBR.”이라고 쓰여 있는데 CBR이 뭘까? 문맥상 화생방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요즘은 CBRN이라고 표현하는 듯.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런 전문적 군사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리라.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이 안내문은 쉽사리 무시되리라는 점에서 일말의 위안을 느낀다.
- 사용하고 싶으면 캐비넷 전면 유리를 깨뜨려야 한다 – 방독면을 철제 캐비넷에 넣어 든든하게 보관해둔 것은 평상시에 장난으로 빼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이해할 수 있다. 비행기 좌석 아래에 비치된 비상용 구명조끼를 훔쳐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말이다. 재난상황 발생시 방독면을 사용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뜨릴 경우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의한 2차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더 나은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 유리를 깨뜨리면 위의 안내문은 보이지 않게 된다 – 방독면 착용 방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고정된 마개 두 개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은 깨진 유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질 듯. 실컷 방독면을 착용했는데 마개를 제거하지 않아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없겠지 설마.
 햄과 치즈가 들어간 빵이 3,800원이니 아주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음식이다.
*가게 이름은 ‘아으 굉장히 맛있다’라는 뜻이고 bröchen은 bread(빵)을 의미.]]>
햄과 치즈가 들어간 빵이 3,800원이니 아주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음식이다.
*가게 이름은 ‘아으 굉장히 맛있다’라는 뜻이고 bröchen은 bread(빵)을 의미.]]>
 얼핏 보아서는 원 안에 길게 그어진 직선이 혹시 ‘걸터앉지 말라’라는 금지의 뜻은 아닌지 살짝 혼란스럽다.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결국 ‘걸터앉지 말라’가 아니라 ‘걸터앉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다.
공간이나 사물 자체가 그것이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즉, medium is the message(미디어가 메시지)인 건데, 예컨대 빈 공간에 의자가 놓여있으면 그 자체로 “앉으세요”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위 지하철의 경우는 공간과 설치물의 용도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림을 추가한 것이리라. 일종의 redundancy(중복)인 셈.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예라 생각되어 사진을 찍어두었다.
한편, 생김새로 보아 앉도록 배려한 듯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실제로는 앉으면 안 되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삼성동 코엑스 건물 1층, 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금속구조물의 경우. 많은 사람이 집결하고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컨벤션 시설의 특징상 방문객을 위해 멋진 벤치를 마련한 듯 보이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아래 사진)
얼핏 보아서는 원 안에 길게 그어진 직선이 혹시 ‘걸터앉지 말라’라는 금지의 뜻은 아닌지 살짝 혼란스럽다.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결국 ‘걸터앉지 말라’가 아니라 ‘걸터앉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다.
공간이나 사물 자체가 그것이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즉, medium is the message(미디어가 메시지)인 건데, 예컨대 빈 공간에 의자가 놓여있으면 그 자체로 “앉으세요”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위 지하철의 경우는 공간과 설치물의 용도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림을 추가한 것이리라. 일종의 redundancy(중복)인 셈.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예라 생각되어 사진을 찍어두었다.
한편, 생김새로 보아 앉도록 배려한 듯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실제로는 앉으면 안 되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삼성동 코엑스 건물 1층, 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금속구조물의 경우. 많은 사람이 집결하고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컨벤션 시설의 특징상 방문객을 위해 멋진 벤치를 마련한 듯 보이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아래 사진)
 오히려 곳곳에 벤치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
박물관 내에 곳곳에 놓여진 일인용 의자도 이와 유사하다. 아쉽게도 그 일인용 의자는 관람객을 위한 의자가 아니다. 관람객이 행여나 작품에 손을 대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찍을까봐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안내 직원을 위한 의자다. 그래서 잠시 비어있는 그런 의자에 일반 관람객이 앉았다가는 이내 쫓겨나기 십상이다.
다리가 피곤한데 박물관 전시실 내에 앉을만한 의자가 없는 것과 마침 의자가 있길래 앉았다가 쫓겨나는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씁쓸할까?
*’걸터앉다”란 단어는 “
오히려 곳곳에 벤치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
박물관 내에 곳곳에 놓여진 일인용 의자도 이와 유사하다. 아쉽게도 그 일인용 의자는 관람객을 위한 의자가 아니다. 관람객이 행여나 작품에 손을 대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찍을까봐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안내 직원을 위한 의자다. 그래서 잠시 비어있는 그런 의자에 일반 관람객이 앉았다가는 이내 쫓겨나기 십상이다.
다리가 피곤한데 박물관 전시실 내에 앉을만한 의자가 없는 것과 마침 의자가 있길래 앉았다가 쫓겨나는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씁쓸할까?
*’걸터앉다”란 단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