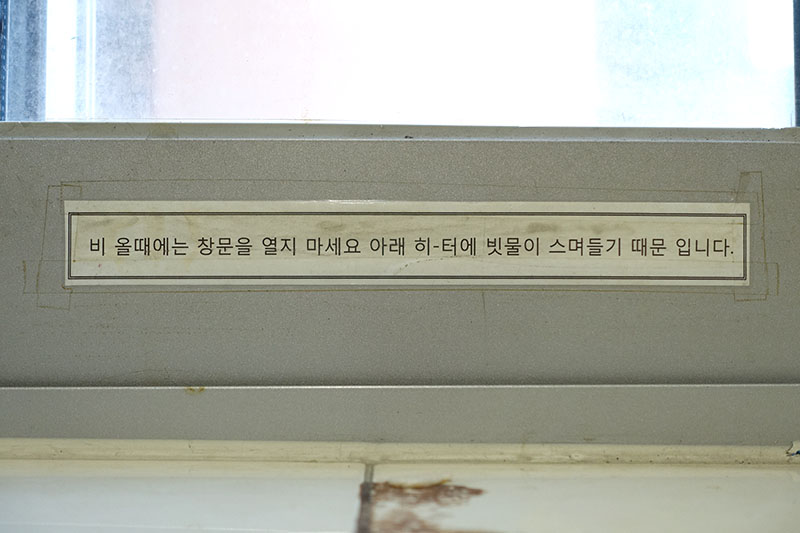카페에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지인을 만났는데 어디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해서 뭐라도 주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치고 허전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해 따뜻한 라떼를 찾는 사람, 잠이 모자라 몽롱한데 아침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진한 드립 커피가 필요한 사람, 점심을 얻어먹어서 체면상 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일행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 집에 있자니 식구들 눈치 보여 조용하고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책이나 읽고 싶다는 생각에 자리를 잡은 사람. 같은 커피 음료라도 구입하는 이유가 같지 않다.
위로가 필요해서 따뜻한 부드러움을 기대하고 라테를 주문했는데 커피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써서 위로는 커녕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면 돈도 아깝지만 기대가 깨어졌다는 배신감에 속이 쓰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주문받은 것은 커피이지 위로가 아니었기에 불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손님의 속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최은희 지음, “카페 가기 좋은 날“, 들녘, p140 “당신의 커피는 무작정 쓸 수 밖에 없군요” 에피소드 참조 — Google Books로 일부를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음)
20년 넘게 미용사로 일한 분이 말하길, 자기는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불과 2-3초만에 지갑에 얼마나 들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던데–약간은 과장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오래 상대하다보면 인상착의를 통한 프로파일링 감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이야기라 생각한다.
카페 주인도 오래 하다보면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는 시선과 말투를 통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손님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듯. 또는 상황에 따른 선택지를 달리한 메뉴판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
즉, Espresso/Tea/Smoothie 등 음료의 종류에 따른 기존의 메뉴 구성에서 벗어나 손님의 상황에 따른 메뉴를 구성하는 것. 스무디킹에서 손님의 목적(Purpose)에 따라 메뉴를 구분한 것이 하나의 예다.(아래 목록 참조)
Fitness Blends
Slim Blends
Wellness Blends
Energy Blends
Take a Break Blends
— from Smoothie King menu
카페 음료를 고객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Contextual Menu for Cafe
Beverages for Connection: 사귐을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ourage: 용기를 북돋아 줄 음료
Beverages for Consolation: 위로를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oncentration: 집중을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reativity: 창의력을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larity: 명료한 생각을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losing: 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음료
Beverages for Celebration: 축하를 위한 음료
C에 맞추느라 위처럼 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으면 어떨까 싶다.
Beverages for Motivation: 동기부여를 위한 음료
Beverages for Big Decisions: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마시는 음료
Beverages for Saying Thanks: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음료
Beverages for Saying Sorry: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음료
Beverages for Cooling Off: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음료
Beverages for Appeasing: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음료
Beverages for Reading: 책읽기에 적당한 음료
Beverages for Reward: 포상 음료
Beverages for Keeping Your Kids Silent: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음료
Beverages for Saying Goodbye: 작별 인사를 위한 음료
Beverages for Going Home: 귀가를 앞두고 마시는 음료
Beverages for Presentation: 발표를 앞두고 마시는 음료
Beverages for Rituals: 예식을 위한 음료
Beverages for Mourning: 애도를 위한 음료
Beverages for Awkward Situations: 어색한 상황을 위한 음료
한편, 음료는 개별적으로 마시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출 수 있지만 카페 내의 배경음악은 개별화하기 어렵겠다. 좌석별로 손님이 원하는 장르의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쨌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의 문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품 개발이든 서비스 설계든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울림이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게 되고, 결국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조장하기 쉽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잠언 25:20 (새번역)
“이른 아침에 큰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 잠언 27:14 (새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