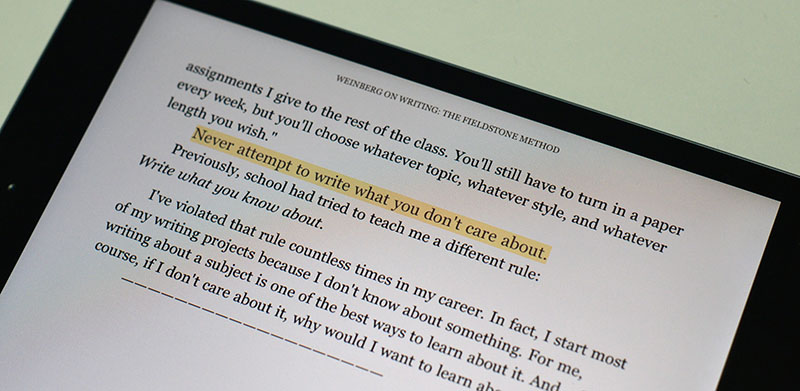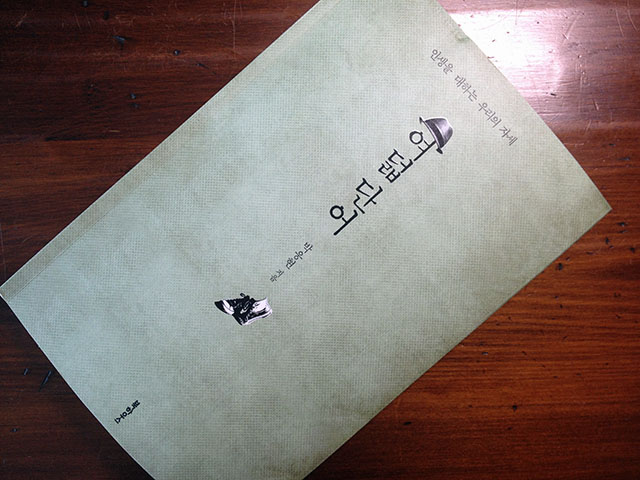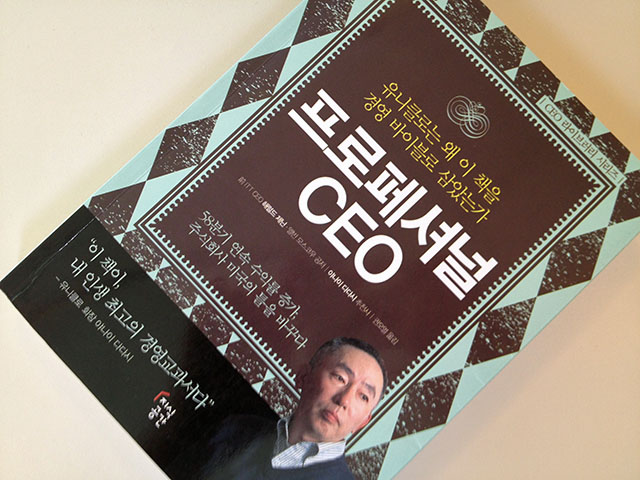부모와 자식이 2대에 걸쳐 책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가족이었던 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는 왠지 모를 불편한 느낌을 갖기도 한다. 부모의 의도와 자식의 기대가 서로 일치, 조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유명인으로서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환상을 깨뜨리는 현실이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브리(L’Abri) 운동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Francis Schaeffer 박사는 나의 20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인데 그의 아들인 Frank Schaeffer도 여러 권의 흥미로운 책을 저술했으나 2008년도에 펴낸 Crazy for God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상대적으로) 어두운 면도 드러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긴장하면서 읽게 된다.
고 옥한흠 목사의 장남인 옥성호 씨도 여러 권의 흥미로운 책을 써낸 바 있는데 간혹 책 속에서 자기 아버지와 연관된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읽으며 괜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난다.

일전에 박웅현 지음 “여덟 단어“를 재미있게 읽고 난 후 그의 딸도 19살의 나이에 책을 냈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읽어 보았다. 박연 저, “인문학으로 콩갈다“, 북하우스 간 (2010).
자기 가족이 사실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을 보고 박웅현 씨 가족사의 어두운 면을 성격이 드센 딸이 마침내 들춰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으나 다행스럽게도–난 긴장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이 아버지와 딸의 경우는 생각과 경험이 서로 공유하는 바가 많고 “여덟 단어”에서 이미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므로 “반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가족 내에서 엄마가 얼마나 큰 지배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함께 여행하며 겪은 에피소드 등,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이고도 솔직하게 적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자기 가족을 가리켜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로 반목하여 뿔뿔히 흩어진 모습이 아니고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서 종속적이기 보다는 자유로운 모습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읽기에는 너무 작은 글꼴로 책이 편집된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치열하게 한 사람답게 글도 짜임새가 있어 좋았고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덕분에 글의 소재도 예사롭지 않아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