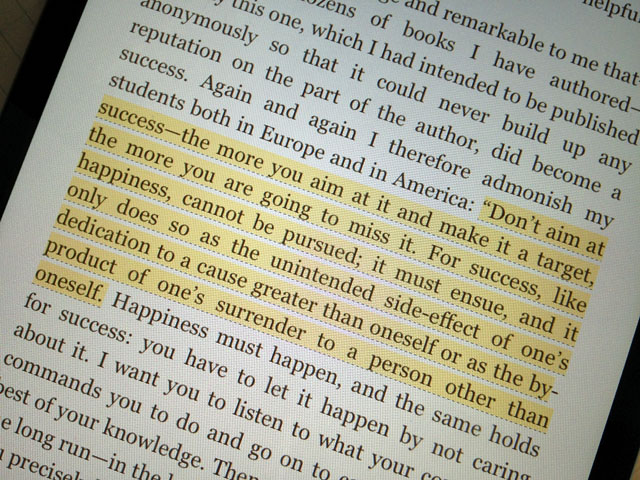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생명과학과 교수 후쿠오카 신이치는 올해 54세의 분자생물학자다. 문학적 재능이 다분한 그는 과학저널리스트로서 책도 쓰고 번역도 하는데 읽어보니 글솜씨가 남다르다.
그의 책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대해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일본 소설가는 “스릴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반역이 빚어내는 흥미진진한 책”이라 평하고 있다. 과학서적에 대해 이런 평을 쓴 것이 의아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과연 그렇다. 그의 책을 읽다보면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다. 예컨대 다음 문장에서 처럼.
6월. 차창 밖 밭에서는 콩처럼 생긴 이름 모를 작물이 눈부실 정도로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초여름 바람이 그 동그란 잎을 모조리 뒤집으며 쓸고 지나갔고, 뒤집힌 이파리의 물결은 저기 저 멀리로 달음질쳤다.
— 후쿠오카 신이치 지음, 김소연 옮김, 나누고 쪼개도 알 수 없는 세상, 은행나무 간, p7
그의 책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분자생물학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어휘가 자주 등장한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읽고 나면 왠지 재미있었다는 인상이 남는다. 마치 마카롱에 아몬드 분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마카롱을 먹고는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의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음에는 공들여 번역한 번역자(김소연)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참고: 번역의 품질에 따라 사람들의 호불호가 얼마나 갈리는지에 대한 단편을 볼 수 있는 포스팅) 번역자인 김소연은 후쿠오카 신이치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다음엔 작가의 문장력에 끌렸다. 분명 과학 서적 같은데 호흡이 길면서도 이 포근하고 사려 깊은 문장은 문학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품이 있다. 깊이 있고 상세한 묘사와 사물을 보는 통찰력은 어쩌면 과학자이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 후쿠오카 신이치,김소연 옮김, 생물과 무생물 사이, 은행나무 간, p248 역자 후기에서
제목에는 3종 세트라고 썼지만 국내에 번역된 후쿠오카 신이치의 책이 두 권 더 남아있다. 일단 쉬었다가 다음에 읽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