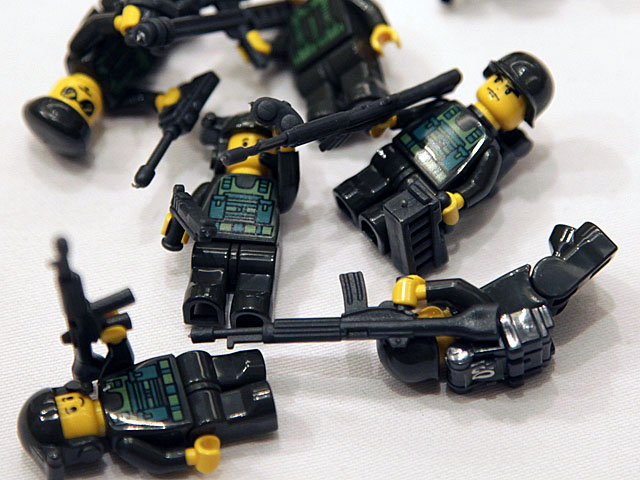“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알아들은 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뿐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연신 끄덕거리는 것을 보니 남들은 다 이해하는가 보다. 아마도 내가 공부를 덜한 탓이겠지. 연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나의 무식이 탄로날까봐 차마 손을 들 수가 없다.”
“출근을 하니 밤새 미국의 다우존스산업지수가 몇 십 포인트나 떨어졌다고 서로들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도 ‘그거 참 큰일이네’ 라고 동조했지만 다우존스산업지수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 구입한 핸드폰에 뭔가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조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사실 속으로는 상당히 찜찜하다.”
과잉 정보의 소용돌이 (Information Overflow)
인터넷의 보급과 사내정보시스템의 발달 덕택에 우리 손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예전 그대로이다. 정기 구독한 전문 잡지들은 포장을 뜯을 새도 없이 쌓여만 가고 책꽂이에 늘어만 가는 읽지 않은 책들은 부담감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 미국, 중국을 넘어 카스피 해를 둘러싼 러시아와 신생독립국의 새로운 유전 개발의 움직임과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산업 동향과 아르헨티나의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한다.
또, 자신의 학창 시절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노테크놀로지는 무엇인지, 수많은 바이오 관련 기술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XML, SOAP, J2EE 등을 비롯한 컴퓨터 및 e-business 관련 용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보고서와 대화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고뇌하기도 한다.
정보 불안증의 증상 (Symptoms of Information Anxiety)
정보 과잉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정보 불안증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예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끄덕끄덕 신드롬 (Uh-Huh Syndrome): 세미나나 대화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나와도 마치 자신이 잘 알아듣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연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 조용히 앉아 있기 (Keeping a Low Profile): ‘어리석은 자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회의나 세미나 시간에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 세미나 등에서 질의 응답 시간이 되면 장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 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문 용어의 과도한 사용 (Excessive Use of Jargons): 정보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를 인용하여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 방어적 언어 구사 (Defensive Speech): 정보불안증에 걸린 사람이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이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화 중에 “당연히” 또는 “당연하죠” 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질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려는 눈치를 보이면 의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거나 다른 곳을 쳐다 보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 보복적 행동 (Retaliative Behavior): 정보불안증의 증상이 심해지면 다른 이들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을 보상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의 전형적인 예는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 현실의 부정 (Denial): 정보불안증의 가장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시작한다.
정보불안증의 극복 (Antidote to Information Anxiety)
지내다 보면 유난히 질문을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져서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답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더욱 큰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에 전혀 인색하지 않다.
각 개인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공동체의 지식은 각 구성원이 나누어 가지는 일종의 분산 저장 체제(distributed storage system)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불안증의 극복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원하는 정보를 필요한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그 기술의 요체는 질문하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왔다. 우리가 정보불안증에 시달리고 세미나 시간에 질문이 없는 것도 돌이켜보면 그럴 만도 하다. 질문하기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보불안증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있는 의사소통의 추구 (In Pursuit of Meaningful Communication)
정보불안증에서 벗어나는 또 한가지 방법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의미한 정보(meaningless information)를 걸러 없애는 것이다. “무의미한 정보”란 문맥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데이터(contextless data) 또는 사용자의 상황과 필요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정보(irrelevant information)를 말한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장식 효과를 목적으로 발표의 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림을 군데 군데 채워 넣거나, 단지 눈에 띄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스펨 메일이나 팝업창을 남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보의 예이다. 또한,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로 자신의 연설문과 대화를 치장하는 것도 걸러 내어져야 할 무의미한 정보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세미나 시간에 질문이 적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연사의 발표가 무의미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하여 의미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자신이 깨달은 말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일만 마디를 지껄이는 것보다 낫다” 는 말처럼, 개인과 조직의 의사소통에서 무의미한 정보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정보의 범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러두기: 이 글은 원래 2002년 7월 29일자로 그 당시 soonuk.com 블로그에 올렸던 글(스토리지 솔루션 업체인 EMC의 사내 잡지에도 기고했었음)인데 이 글을 ‘퍼’ 갔던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어서 다시 가져와서 일부 수정했다. ‘펌질’이 일종의 사회적 백업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글의 내용은 TED 컨퍼런스를 시작한 Richard Saul Wurman의 책 Information Anxiety를 통해 배운 바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이 책이 쓰여진 지 20년이 지난 2010에도 여전히 insightful한 저자의 최근 강연 동영상도 볼만하다.